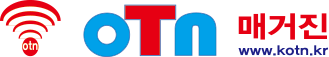<신 청풍명월의 지난소식> 불당이나 불탑이 없던 인도에서도 오래 전부터 열반한 부처와 그 제자들을 기념하는 기념물로서 공을 반으로 자른 형태로 흙과 돌로 쌓아 올리다 꼭대기 부분은 약간 평평하고 그 위에 네모난 돌난간을 두르고, 중앙의 기둥에는 둥근 지붕을 씌운 형태로 신도들의 유골을 묻는 장소가 있었다.

즉, 부처와 불법을 닦은 고승들이 열반한 후 유골 즉, 사리를 묻는 장소로서 일종의 묘지에 가깝던 것을 고대 인도어로 스투파(stupa : 솔탑파 또는 사리탑이라고도 함)라 하는데, 대개 그 신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기념할 만한 장소에 세우기도 했던 스투파는 불상이 모셔진 불당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에는 가장 존엄과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사찰의 중심부인 불당 바로 앞에 건립하고, 또 탑의 기원이 되었다.
이러한 스투파가 파리어(巴梨語)로 투파(thupa)라고 했는데, 불교가 중국에 전래될 때 thupa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 탑파(塔坡)또는 탑(塔)이었다.
그 후 4세기 초 중국에 들어온 탑은 현재의 탑과 같은 여러 층의 건물 형태를 취했는데, 이 탑은 pagoda라 하여 stupa와 구별하기도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불교의 상징으로 굳어진 탑(pagoda)은 탑의 기층을 이루는 기단부, 탑의 몸체를 이루는 탑신부, 탑의 꼭대기를 이루는 상륜부의 3단계로 구성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벽돌 탑이었으나,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에는 목탑이 주류를 이루어서 부여 군수리 절터의 목조탑지와 금강사의 목조탑지 그리고 경주의 황룡사 9층탑 같은 거대한 건물을 세우게 되었지만, 분황사 모전석탑(模塼石塔)과정을 거쳐서 점점 석탑이 주류를 이루었다.
목탑을 석탑으로 바꾼 것은 백제인들로 삼국시대의 석탑으로서 단아한 형태와 비례미를 갖춘 대표적인 탑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국보 제9호)이 있다.
정림사지는 1942년 발굴 당시 출토된 고려시대의 암키와에 새겨진 명문으로 1028년 당시 절 이름이 `정림사`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이곳에서 출토된 도용은 모두 90여 점으로서 관리, 무사, 시녀 등의 모습으로 중앙아시아나 북위의 양식과 비슷한 특이한 관모, 눈이 깊고 코가 큰 이국적인 모습들이 백제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추정하게 해주고 있다.
여말에 이르러 원에서 들어온 라마교의 영향으로 탑의 모양도 부도(浮屠)가 유행했는데, 부도란 원래 불타와 같은 범어 buddha를 번역한 것으로서 솔도파(率堵婆) 또는 탑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어원상으로 보면 불타가 곧 부도이니 불교의 상징물인 불상이나 불탑이 모두 부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부도라면 대체로 승려들의 사리를 모신 묘탑을 의미한다.
부도는 라마교의 영향으로 둥근 모양의 석조물 안에 사리를 모시고 그 위에 연꽃모양의 석등을 만드는 것이 유행했는데, 충청지방의 대표적인 부도는 고려 현종 때의 충주 정토사 홍법대사 실상탑(弘法大師 實相塔 : 현재 경복궁에 이전)이 유명하고, 공주 갑사 부도(보물 제257호), 고려 경종 3년(978)에 세운 서산 보원사지의 법인국사 탄문(法印國師 坦文)의 부도(보물 제105호), 부여 무량사 경내에 있는 매월당 김시습 부도(유형문화재 제25호), 논산 탑정리 부도(도 유형문화재 제60호) 등이 있다.
문자를 모르는 일반 민중에게 불교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한 불화는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될 때 함께 전파된 것으로 고구려나 백제의 고분벽화나 사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반도에 토착화된 불화는 백제 위덕왕 24년(577)에 여러 승려와 불상 및 불공들에 의해서 다시 왜에 전래되었으며, 고구려도 영류왕 21년(610)에는 담징이 왜의 나라에 있는 법륭사에 금당벽화를 그렸다는 기록도 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매우 드물고 고려 말인 13세기 말경부터 약 1세기 동안 제작된 불화가 있다.
불화는 인도 아사세 왕 때 석가의 일생을 8장면으로 표현하여 그린 석가팔상도가 가장 대표적이고, 불상과 같이 본존불화인 여래화와 보살화로 나눈다.
우리는 불상이라는 조각예술과 달리 불화들을 통해서 당시 고려인들의 불심과 예술기법 그리고, 그림 제작수준 등을 엿볼 수 있는데, 본래 인간의 사후세계를 천상과 지옥으로 나누는 이분법은 기독교나 불교 등 모든 종교에서 공통된 방법이지만, 특히 불교에서는 지옥을 연상시키는 온갖 불화와 불상들을 두고 불자들에게 지옥을 경고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강조하여 중생들에게 살아생전에 덕을 쌓아 극락정토에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보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불화의 제작은 대중에게 불교세계를 보다 더 쉽게 전도와 이해를 위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예술기법과 채색기술 등 미술사적 측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 불화는 불교만의 특징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톨릭의 영향으로 내려온 유럽 각국의 사원마다 문맹자인 신자들을 위해서 그림이나 조각으로 설명한 유물들이 많으며, 아랍과 동남아 이슬람국가에서도 문자대신 조각으로 종교적 생활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의 조각이나 인도시아 보드부드로사원의 조각들에서 잘 알 수 있다.
한편, 사찰에서 법요식과 같은 큰 불사가 있을때 내걸었던 불화인 괘불(掛佛)은 탱화(幀畵)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불교문화재이다.
탱화는 사찰에 많이 남아 있지만, 충청지방의 괘불로서 보물 이상으로 지정된 것만도 공주 마곡사의 석가모니불 괘불탱(보물 제1260호), 천안 광덕사 노사나불 괘불탱(보물 제1261호), 홍성 용봉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262호), 예산 수덕사 노사나불 괘불탱(보물 제1263호), 서산 개심사(보물 제143호)의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264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탱(보물 제1265호), 속리산 법주사 괘불탱(보물 제1259호) 등이 있다.
절에서 승려들에게 시간을 알리거나 의식을 거행할 때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종은 중국에서 비롯되었는데, 삼국시대 중국에서 전래된 범종은 고려 초까지는 중국양식이 그대로 이어져 오다가 고려 중기 이후부터 토착화돼 12세기경에는 제작기법 등이 중국이나 일본 종과는 다른 독특한 범종을 만들면서 학명상으로도 조선종(朝鮮鐘)이라는 고유명사를 갖게 되었다.
조선종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종의 몸체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벌어지는 경향이면서 종신도 점점 짧아져서 신라 종처럼 늘씬한 멋이 사라지고, 종신의 윗부분도 신라 종에서는 볼 수 없던 연꽃모양의 장식이 새로 첨가되고, 몸체도 종래의 비천상 대신 독존상이나 혹은 삼존불상 같은 보살상이 새겨지기 시작하였다.
그밖에 물고기를 형상화한 법구로써 승려들이 자주 쓰는 목탁(木鐸)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목어(木魚)라고 하는데,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깎아서 그 속을 파내어서 다른 나무막대기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목탁의 손잡이는 물고기의 꼬리가 몸쪽으로 붙은 형태이고, 목탁에 뚫어져있는 두 구멍은 아가미를 뜻한다.
승려들이 물고기를 형상화한 목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눈을 뜨고 산다는 물고기를 형상화하여 지님으로써, 중생을 계도하고 게으른 수행자의 나태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승려들이 목탁을 사용하게 된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동굴에서 수행하던 승려들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독경을 하다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수행하면서도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또, 목탁과 같은 기능을 하는 풍경(風磬)은 사찰의 처마나 탑의 지붕처럼 생긴 부분에 대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매다는데, 물고기는 사찰 건물의 벽이나 기둥같은 곳에도 그리는 것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 때문에 사찰에 화재를 예방한다는 주술적 의미도 있다. <법무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