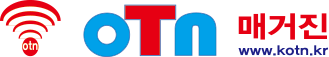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 (1)
1971년 10월 3일은 개천절이자 주일이었다. 그날을 골라 활빈두레운동이 시작되었다. 청계천 빈민촌에서 활빈교회(活貧敎會)를 시작하였는데, 그때 내 나이 30세 장로회신학대학 2학년 재학생이었다.
그때 생각하기를 목사가 되어 평생을 성직자로 살며 목회하겠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이왕지사 목회를 하려면 편한 길 쉬운 길 찾으려 들지 말고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 목회를 하자는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찾아낸 마을이 청계천 하류 송정동이란 판자촌이었다. 송정동 74번지 한 지역 안에 1600여 세대가 몰려 살고 있는 빈민촌 중의 빈민촌이었다.
그 지역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입주하여 빈민들과 꼭 같은 수준으로 함께 살며 빈민선교를 펼치자는 생각으로 1971년 10월 3일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그 마을에 살다 보니 20대 젊은 청년들이 한낮에 골목에서 담배치기를 하며 놀고 있었다.
물론 일자리가 없던 시절이었던지라 일감이 없어 놀고 있는 모습이 이해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20대 한창 나이에 할 일 없이 놀고만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찾아낸 일이 넝마주이였다. 송정동 판자촌은 뚝섬지역이 가까웠는데 뚝섬지역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았다. 그래서 공장에서 매일 버리는 쓰레기가 많았고 그 쓰레기 속에는 쇠붙이, 박스, 비닐, 깡통 등 쓸만한 물건들이 많았다.
그 점에 착안한 나는 마을 젊은이들을 모아 쓰레기를 모으고 분류하여 폐품공장으로 넘기는 일을 시작하였다. 마을 젊은이들이 처음엔 창피한 일이라면서 꺼려하기에 소주에 삼겹살을 사 먹여가며 설득하였다.
“젊은 나이에 놀면 몸도 마음도 병든다. 일에는 귀천이 없는 거다. 우리 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에,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물건을 모아 공장으로 보내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는 애국운동이다. 그러니 넝마주이라고 창피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애국 사업하는 일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일하자!“고 거듭 설득하였더니 차츰 마을 젊은이들이 호응을 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넝마주이 일꾼들의 구호가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뚝섬지역에서 공장들을 돌며 쓰레기 줍기를 시작할 때에, 내가 대원들을 모으고 일장 연설을 하였다.
"우리가 비록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일꾼들이지만, 우리가 쓰레기는 아니다. 바닥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하늘을 보며 꿈을 기르고 비전을 기르는 일꾼들이 되자. 그런 뜻에서 우리는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는 구호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자!"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몸을 사리며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몸을 숨기려 하였으나, 날마다 이런 정신과 용기를 불어 넣으며 일하게 되니 차츰 긍지가 생겨나고 자신감이 자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