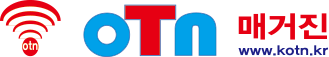박정선 시인은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금산여고와 공주교육대학교,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2010년 『호서문학』으로 등단하였다. 현재 대전중원초등학교 수석교사로 있다.
산다는 것은 사라지는 과정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기에 어떤 존재도 사라질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는 그 과정 속에 잠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라짐의 의미 즉 무를 안다는 것은 나를 아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나를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불교에서 무아의 경지를 말하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항상 망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축적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를 더 욕망하여 자신의 삶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래야 사라지지 않고 남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집착이 세상과 나를 힘들게 만든다. 문학이 그리고 특히 시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거기에 처한 주체의 성찰을 담아내는 것이라면 바로 이 사라짐에 대한 번민은 피할 수 없다. 박정선 시인의 이번 시집의 시들은 바로 이 사라짐으로부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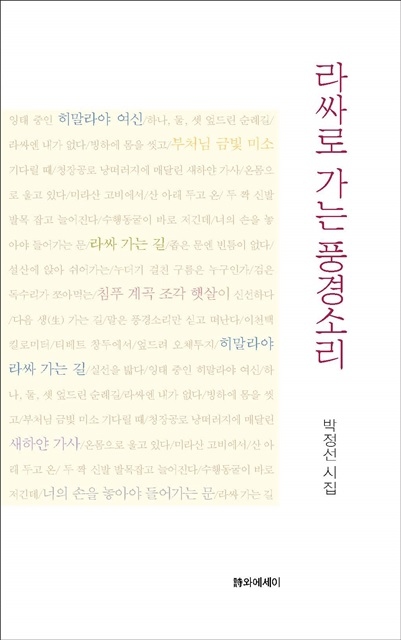
한 줄/꺼내어 다급하게 읽는 소리/저만치서/흩어진 발걸음 수북하게 들려온다//가시덤불 사이로/마른 무덤가를 빠져나온 초승달이/논둑에 앉아/그 사람 이름 불태운다//다 저문 저녁/이른 봄볕에/그을린 산수유 입술만 샛노랗다. <저만치서> 부분
이 시에서 사라지는 존재는 “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라짐을 시인은 ‘이름을 불태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라지는 순간이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시인은 그 이름을 불태워야 할까? 그것은 “마른 무덤가를 빠져나온 초승달”이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무덤에서 나온 초승달은 죽음으로부터 탄생하는 새로운 생명력이다. 이 새로움은 결국 죽음과 소멸을 딛고 나온 것이다. 자기가 소망하는 “그 사람” 역시 자신의 마음속에서 소멸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다른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다. 우리가 욕망하는 실체 없는 그 이름을 불태워 없앴을 때 비로소 “이른 봄볕에/그을린 산수유 입술만 샛노랗다”에서처럼 새로운 존재의 강렬한 구체성을 마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소멸은 가장 강력한 존재의 형식이다.
보고만 간다/밟고만 간다/어디로 가려고/제 살점 도려내고 이탈했을까/만다라 이끼가 발길을 막는다/붉은 신호등 밟고 지나간다/싱싱 활어회 차 속에서/살찐 바다 멀미소리가 역겹다/신기루에 눈먼 사이/설익은 중생의 실수인가/보리수에 긴 한숨 걸쳐있다/둘러대며 또 서둘러 떠난다/발을 헛디뎌/8차선대로에 떨어진/노란 인생 한 줌 주워 물어본다.「파지」전문
파지는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들의 부속물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지 못하는 의미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므로 그것은 존재가 아니기도 하다. 하지만 시인의 눈은 그 존재 아닌 존재를 바라보고 있다. 그 파지가 감싸 안았을 또 다른 존재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것들은 “신기루”이거나 “멀미”로만 기억되는 “활어회” 같은 “살찐 바다”였을 뿐이다. 다 서둘러 떠나버린 사라지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바로 그것들이 사라지는 자리에 “노란 인생”으로 파지가 남는다. 시인은 이 파지를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 우리의 삶이란 “붉은 신호등이 밟고 지나”가듯이 위험과 고통의 연속이고 “만다라의 이끼가 발길을 막”는 것처럼 잠시 동안의 위안에 머뭇거리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두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남는 것은 찢겨진 파지이지만 그것도 역시 찢기고 찢기다 결국 사라질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시인에게 포착되는 그 순간의 존재감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하다.
망초가 터전을 잡더니/올해부턴 질경이, 쑥, 민들레/제비꽃, 곰보배추, 애기똥풀까지/비집고 들어와 뿌리를 내린다/고샅길이/풀벌레들 놀이터로 시끌벅적하다/흰 고무신 발자국도 너울거린다/아버지/고샅길에 나와앉아 계신다/하얀 찔레꽃 아래로/얼큰하게 취한/꽃뱀 한 마리 지나간다/쓰윽. 「흔적」 전문
질경이, 쑥, 민들레 같은 온갖 식물들과 고샅길, 흰 고무신 같은 시인이 기억해내는 모든 사물들은 사실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기억보다 더 강력하게 이 시 속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흔적’이다. 시인은 그 흔적을 “꽃 뱀 한 마리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흔적은 뱀이 지나가는 것처럼 순간적이고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꽃뱀”이라는 용어가 주는 느낌처럼 강렬한 것이기도 하다. 기억이 우리 뇌리에 강한 느낌을 남길 때 그것은 흔적이 되고 상흔으로 남을 때 트라우마가 된다. 그런데 시인은 기억의 흔적을 꽃뱀에서 찾고 있다. 그것이 주는 섬뜩한 공포와 현란한 아름다움이 시인에게 그런 강렬함을 남겼으리라.
라싸 가는 길/좁은 문엔 빈틈이 없다/설산에 앉아 쉬어가는/누더기 걸친 구름은 누구인가/검은 독수리가 쪼아먹는/침푸 계곡 조각 햇살이 신선하다/다음 생(生) 가는 길/말은 풍경소리만 싣고 떠난다/이천백 킬로미터/티베트 창두에서/엎드려 오체투지/히말라야 라싸 가는 길. 「라싸로 가는 풍경소리」 부분
고행이 고행으로 끝나지 않고 오체투지하여 정상까지 나아갈 힘을 주는 것은 “풍경소리” 때문이다. 그것은 사라져가고 불안하고 순간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구체적인 기억의 형식을 부여하고 우리의 정신에 흔적을 남긴다. 바로 시나 예술이 그런 것이다.
박정선의 시들은 사라지는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욕망에 새로운 기억의 형식을 부여한다. 그것은 바로 흔적의 형식이다. 쓴다는 행위가 흔적을 만들고 그 흔적이 사라져가는 기억들에 생생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일상에 매몰되어 소멸되어 가는 우리의 존재를 일깨운다.